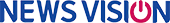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 故 최동원 선수의 10주기를 맞아 ‘1984 최동원’ 극영화 다큐가 11월 11일 개봉되었다. ‘11’은 생전 그의 등번호였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부를 창출했던 무쇠팔의 소유자 최동원 투수의 투혼을 담은 추모 영화다. 그는 1984년 가을 당시 가장 강력했던 삼성 라이온즈 팀을 상대로 열흘간 한국 시리즈 7차전 중 5경기에 등판, 4승 1패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야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고,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야구하자”라는 의미에서 받은 그의 등번호 ‘11’은 롯데자이언츠 최초로 영구 결번되어 사직구장에 새겨졌다. 그야말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인명호피(人名虎皮)’라는 사자성어의 의미가 고스란히 구현되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의 이름 석 자를 남기게 만들었는가. 그는 분명 자신만의 브랜드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어쩌면 그의 투혼은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적인 열정과 신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분명 그는 남달랐다. 승부사적인 기질,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첫 스포츠 스타’라는 평가, 당시 프로야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라이벌 대결구도’ 형성을 통한 팬 동원 능력이었다.
위기 시 마다 아주 대담한 선택과 집중력을 발휘하였고,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금테 안경을 번뜩이며 두둑한 배짱을 발휘했다. 가장 본인이 믿을만한 투구로 상대를 압도했던 승부사 기질과 투혼은 상대 강타자를 완전 압도하였다. 특히 롯데 시절인 1984년 한국시리즈 4승 기록을 위해 그가 보여주었던 혼신의 역투는 여전히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마운드 아래에선 누구보다 팀 동료들을 위해 푸근한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야구 영웅이었지만 약자를 먼저 생각한 최초의 프로 야구 선수이자 스포츠 스타로 기억되고 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스타 선수가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1988년 일종의 노조격인 선수협의회를 구성하려다 삼성 김시진 투수와 맞트레이드 되었지만 야구 후배들에게는 맏형의 구실을 과감히 마다하지 않았다.
“스타는 관중이 만든다”는 이야기에 딱 맞는 스토리가 있다. 한국 프로 야구 역사상 가장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하면 故 최동원과 선동렬 전 국가대표 감독을 꼽는다. 두 투수간의 맞대결은 지금도 회자되는 KBO리그 최고의 명투수전이다.
부산출신인 최동원과 광주출신 선동렬은 당시 각각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투수였다. 특히 명문고와 명문대간의 라이벌전은 야구팬들을 더욱 끌리게 만들었다. 최동원은 경남고를 거쳐 연세대를 나왔고, 선동렬은 광주일고를 거쳐 고려대를 졸업해 지연 및 학연이 조합된 라이벌이었다.
여기에 전성기 시절 150km/h를 넘는 두 사람의 최고구속 경쟁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구질도 달라 최동원은 커브볼을, 선동렬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았다. 이른바 이러한 연고, 성장 배경, 테크닉 등 거의 모든 것에서 정반대를 이루는 점에서 라이벌구도가 형성되면서 대결, 대립구도는 프로야구를 더욱 훨씬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최동원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오랜 기간 누적된 혹사로 인한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1989년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된 후 1991년 은퇴를 했다. 반대로 선동열은 무려 0점대의 시즌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다 1996년 초 일본으로 진출했고 1999년 은퇴하게 됐다. 어쩌면 두 선수 모두 꿈에 그리던 미국 메이저 리그를 진출하지 못했던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는 대목이다.
故 최동원 선수가 노력파라면 선동렬 선수는 천재파로 평가 받고 있다. 최동원 선수가 1%의 재능과 99% 노력이 있었다면 선동렬 선수는 99% 재능이 있었던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그의 부단한 노력과 투혼, 승부사 기질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원은 이후 2010년부터 지병인 대장암이 재발해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향년 53세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아들의 동상을 닦는 지극한 정성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으며, 롯데 팬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과거 화려했던 최동원 선수의 생생한 기억을 더욱 되살리게 하고 있다.
비롯 최동원 선수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영원한 야구인 최동원 투수의 존재는 영원히 사직구장과 함께 롯데 팬들의 우상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부산 야구팬들은 여전히 부산의 롯데보다 부산의 최동원 때문에 사직구장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최동원을 사랑하는 수많은 야구 후배들은 지금도 레전드 최동원의 ‘꿈’을 꾸면서 공 하나하나를 던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남긴 ‘야구 혼’을 잇고자 지금도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은 유한하다.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난다. 이에 누구나 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순간에 죽어 영원히 산다‘라는 삶의 법칙을 깨닫기는 쉽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남는 자‘와 ’사라지는 자‘의 차이다.
1984년 가을의 전설 신화를 우리에게 남겨준 최동원 투수는 영원히 부산 팬들과 함께 사직구장에 살아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로운 곳에 남이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는 ‘승부사 기질’을...
이상기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부총재 sgrhee21@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