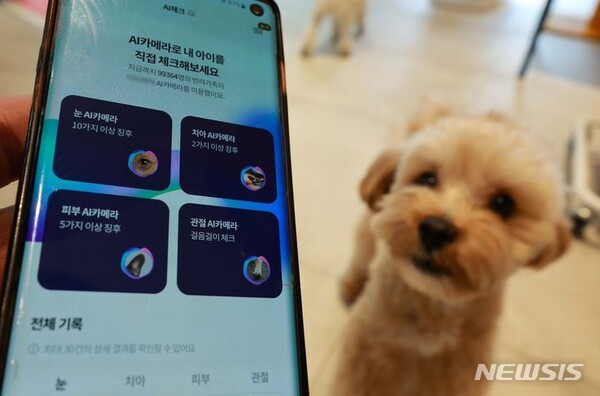
최근에 자주 회자되는 '무용 계급'이란 말을 사유한다. 이건 인공지능이 기존의 경제 구조를 파괴하고 많은 노동력을 대체해 쓸모가 없어지는 인간들을 말한다.
소수의 인공지능 엘리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며 군림하고 대다수는 가난해지며 불평등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이 말은 유발 하라리가 언급했던 거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들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들을 보면, 예컨대, 무인 편의점,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차량이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요금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 국내 보험사나 은행들의 AI 챗봇 메신저, IBM 왓슨 인공지능 의사 등을 보면, 45-50%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암기, 단순 노동, 반복 업무에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유발 하라리는 "무용 계급"이라 했던 거다.
21세기 인류의 위기이다. 그럼 인간은 이대로 도태되어서 기계에 정복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AI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한다. 누군가는 창의적 활동, 예술과 같은 행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AI가 만들어낸 작품들만 보아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인간이 만든 건지, 기계가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빠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정보가 정말 주체할 수 없게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 속도는 점점 더 가속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능력이 '요약하고 판단하는 힘'이다.
쉽게 말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요약'이란 단순히 콘텐츠의 길이를 짧게 다듬고 줄이는 수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요약'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약할 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는 것이다. 일에서도, 삶에서도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다는 거다.
더 나아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 '요약하는 힘'이 필요하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살아 남는 사회는 끝났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판단력을 키우는 법은 '요약하는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요약하는 힘'을 기르려면, 메타 인지를 통해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메타인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지 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한 마디로 자기 성찰 능력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식에 대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나 아니나 스스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만드는 거다.
그래 '호모 프롬프트 (Homo Promptus)'라는 말이 등장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의미한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 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화룡점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김창환 공주대학교 행정학박사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