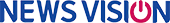최근 개봉한 영화가 탄핵시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눈길을 한껏 끌고 있다.
영화 이름은 ‘콘클라베’. 뜻 그대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이야기다. 교황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 몰고 온 음모와 탐욕 등을 다룬 미국 영화다.
콘클라베를 위해 전 세계에서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모여들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조용한 충돌이 시작된다.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포섭하고, 스캔들을 이용하고, 부정을 저지른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를 피우는데, 정치적 암투 등을 이유로 콘클라베는 사흘째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때 누군가 얘기한다. 교황 선출이 늦어지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것.
어찌보면 세상만사 모든일이 정해진 날짜나 시간이 상식적으로 지나가면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마치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감에 빠져들게 한다.영화 초반부, 콘클라베가 시작되면서,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은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을 한다.그는 의례적인 문장을 잠시 읽어 내려가다가 고개를 들더니 “마음 속 이야기를 하고싶다”며 말했다.
순간 참석한 추기경들은 쥐죽은 듯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확신(certainty)’ 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로렌스 추기경은 의심하는 교황,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실천하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자며 강론을 맺는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로렌스 추기경의 바램과는 달리 교황이 되려는 확신에 찬 자들의 탐욕과 음모가 상상을 넘어서 요동을 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이뤄졌다.
23일까지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공지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 2월 25일 종결됐다. 숙의 기간만 무려 한 달째, 국정공백과 여,야간 진영논란은 심리적 내란사태까지 이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여당은 ”이제 대통령은 직무에 곧 복귀할 것“이라며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5당 역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끈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며 최고조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이같은 여,야의 태도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은 양진영 모두에 대해 불신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쪽 진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용을 바라는 쪽도, 기각을 외치는 쪽도 모두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말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뒤섞여 서로 다른 확신을 목이 터져라 외친다.
국가신임도은 물론 경제는 무너지고 자영업자는 탄식을 넘어 이제는 절망에 빠져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방면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듯 싶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한 가운데 헌재 결정만 멈춰 서 있다.
뒤늦은 판결은 더 큰 혼란
헌재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5천만 국민에 대한 최고 헌법의결기관의 책임이다. 더 이상 탄핵선고에 대한 지연은 숙의라고 볼 수가 없다. 단지 침묵으로 비칠 뿐이다. 광장에서는 의심을 넘어 확신에 찬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선고가 오는 3월 26일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항소심 재판보다 훨씬 더 늦어져 4월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흘러 나온다.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늦출수록 정치적 고려가 판단을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가 없는 실정이다.이제 헌재의 본질마저 의심받는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둘로 쪼개진 여론 위에 내려진 신뢰 없는 뒤늦은 판결은 훨씬 더 큰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더 늦기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양 진영 모두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영화 콘클라베가 탄핵정국에 주는 함의는 그래서 어느 정치적 메시지보다 확실한 빛을 발휘하고 있다.
김창권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