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 · 지방균형 발전을 골자로 한 '새정부 산업정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 독일 · 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해 이번 산업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 · 독 · 일 · 중 4개국은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리쇼어링, 수입규제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부흥전략을 통해 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노동 · 일자리 등 경제 · 사회 전반의 성장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산업 전략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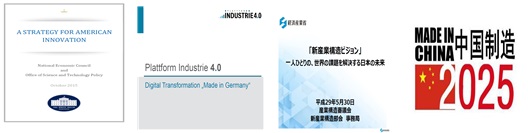
◆ 미국 -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의 시장 선점 지원 정책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선점하고 제조 · 문화 등 타 산업과 융합하면서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짐임과 함께 미국 정부는 원천기술 투자, 스타트업 활성화 등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고 대규모 실증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JOBS법(Jump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제정하는가 하면, 'America First' 등 자국 위주의 강력한 통상 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 등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 독일 - 강력한 제조 기반 활용해 경제체질 개선 주력
독일은 지멘스, 보쉬 등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산업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에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에 11개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기술 공유, 실증 등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Mittelstand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Arbeiten 4.0' 등 경제 사회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일본 - 기술 강점 활용한 정부 주도의 국가혁신 도모
일본은 민간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늦었지만, AI · IOT · 로봇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육성, 고령화 · 지역경제 침체 대응 등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소사이어티 5.0'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 중국 -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발빠른 추월전략 추진
중국은 막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드론 분야의 DJI, 전기차 부문의 BYD, 전자상거래 부문의 알리바바(Alibaba), 검색 부문의 바이두(Baidu) 등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차원에선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중 · 장기 산업 전략과 강력한 시장 개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미 컬럼비아대학교 경영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산업정책의 회복(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2015)'이라는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노동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산업정책의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과 함께 대기업 중심이었던 우리경제의 체질변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