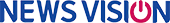흔히 정치판과 노름판, 남녀 간의 밀당이 핵심인 연애는 요동을 쳐야 제격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정치판에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정치 신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등판은 정치판의 모든 이슈를 삼키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몰고 올 듯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실망했고, 심지어 정치를 외면하는 조짐마저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2인자나 후계자가 조기에 등판한 경우는 현재 권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식물정권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한동훈의 조기 등판을 강제했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전만 해도 여론은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4월 총선 전망도 국민의 힘에 상당히 불리했고, 사실상 식물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한동훈 카드이다.
처음 한동훈의 등판은 화술, 용모 면에서 한껏 돋보이며 신선하게 다가왔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며 예상외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지지율도 민주당을 훨씬 능가할 컨벤션 효과마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등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1차 윤-한 갈등은 폴더 인사를 한 후 일단 봉합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호사가들은 1차 갈등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찌 됐든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들어 준 것이다. 약속 대결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1차 갈등 사태를 한마디로 윤석열의 준비되지 않은 ‘선공’으로 시작됐다.
수의 계산이나 시나리오 없이 대뜸 지르면서 한동훈에게 당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 약속 대련으로 1차 윤-한 갈등이 발생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은 필자가 접촉한 대부분 정치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과정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의 거취 논란, 그리고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에서 드러난 2차 윤-한 갈등은 또한번 국민이 실망하기에 충분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0년 내내 법조계에서 생활한 초자 정치인 한동훈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한동훈은 처음 등판한 이후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그 대표적인 어법이 300명만 공유하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명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위원장은 출범 이후 전국을 돌며 방문 지역과 자신의 인연을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정치권에서 사용해온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위원장은 모순된 행보와 어법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게 현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세대 교체, 야권 심판, 운동권 심판을 앞세운 이른바 한동훈의 반란은 성공할까. 한동훈 나름대로 총선 최대 이슈로 이러한 생각을 부각시키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20여일 남은 지금 총선 판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의 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초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필자만의 착각일까? 곰곰 되새겨 볼 시점이다.
김창권 정치전문 대기자 ckckck1225@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