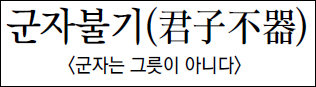
통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할때 '그릇'이 크다 작다로 표현 한다.
'그릇'은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자 위정편에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구절이 나온다.
어짐(仁)을 행하는 사람(군자)은 그릇처럼 하나의 물건을 담는 데에 쓰이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상황에 맞게 일을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위해 인격수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자가 말하는 삼가해야 할 행동 4가지를 강조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지식을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 배움을 증명한다. 공자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진짜 배움은 아는 것보다 실천에 있다고 말한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 네 가지는 공자가 경계했던,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1. 화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터뜨린다
공자는 “성내되 도리에 맞게 하라”고 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없다.
사소한 자극에도 곧바로 분노로 반응하고, 그 여파로 관계를 깨뜨리곤 한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신뢰도 쌓지 못한다.
2. 남을 헐뜯으며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소인은 남을 헐뜯는다고 말했다. 못 배운 사람일수록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려 한다.
그러나 타인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3. 자기 말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과오”라 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틀린 말에도 집착하며, 고집으로 버티려 한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틀림을 부끄러워하지만, 배운 사람은 틀림을 배움의 계기로 삼는다.
4. 겉만 꾸미고 속은 돌보지 않는다
공자는 겉모습보다 마음가짐과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학문 없는 외모 치장은 허상일 뿐이며, 겉은 그럴듯해도 내면이 비어 있으면 결국 티가 나게 돼 있다.
진짜 배움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배움이란 책을 많이 읽는 일이 아니라, 말과 태도에 책임을 지는 자세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결국 인간의 격은 지식이 아니라 품에서 드러난다.
배움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일이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성심省心관리를 잘하며, 항상 성품을 경계하는 즉, 계성戒性을 잘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김창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