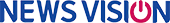국격 높인 양궁과 위상 달라 아쉬움
올림픽 종목으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

지날 25일 일본 도쿄 시내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 게양된 태극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 더위에 몸과 마음이 상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더욱이 일본 땅 한복판에서 양궁 여자 단체전이 올림픽 9회 연속(36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그 의미는 배가됐다.
반면 같은 날 벌어진 '국기' 태권도는 국격을 높여 준 양궁의 위상과는 사뭇 달라 아쉬움을 더했다. 전날 남자 58kg급에서 동메달 1개에 그쳤던 한국 태권도는 믿었던 남녀 두 명의 유망주마저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구겼다. 일본이 시범종목 가라데로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그렇다.
과연 이번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태권도 선수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다.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그들의 지난 흔적은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넷 검색만 하고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친 한 남성 태권도 선수는 지난 2018년 12월 동료선수들과 함께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새벽 시간에 음주하고 돌아온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뒤늦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모두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대한체육회는 바로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으나 이때도 태권도협회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금메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여성 선수도 지난 2018년 음주 운전을 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다 논란이 일자 결국 출전을 포기했다.
지난 36년간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한국 여자 양궁 '금빛 명중'의 비결은 뭘까. 올림픽에서 매번 빛나는 한국 양궁의 동력은 ‘철저한 원칙주의’에 기인한다. 양궁은 과거 국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 당시, 최고 기량’의 선수를 발탁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선발 원칙과 대한양궁협회의 변함없는 과학적이고도 디테일한 지원·훈련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최강의 실력을 대물림해온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하무적’ 한국 여자 양궁의 완전무결한 챔피언임을 입증한 원동력인 셈이다.
치밀하고 꼼꼼한 사전 리허설도 한몫했다. 양궁협회는 진천 선수촌에는 일본 현지 경기장과 입지 조건이 유사한 양궁장 세트를 설치해 주어 매일 시뮬레이션 훈련과 바닷가 특별 전지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기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사전에 경험토록 했다. 최강자의 입장이지만 겸허한 자세로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완벽주의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다.
양궁이나 태권도 승부는 모두 한두 점 싸움의 막판 치열한 승부 싸움이다. 이른바 선수의 자기관리와 노력, 코치진의 과학적인 훈련 기법과 상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와 이에 상응한 전략, 엄격한 원칙 적용과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경기주관 단체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좋은 경기력이 발휘되는 법이다.
이번 도쿄올림픽 태권도 졸전은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독보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문화, 차별화, 디테일화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른바 현장과 행정의 ‘퍼펙트 결합’을 통해서 ‘완벽한 기능’이 작동되는 법이다. 태권도가 양궁의 신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더 많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종주국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우리가 외치기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상기 논설위원(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부총재) sgrh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