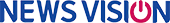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뉴스비전e] 푸켓에 있는 여행사에서 일할 때입니다. 피피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꼬리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브라질 국기가 그려진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에도 브라질 국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브라질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 대신 미소를 지었고 나는 자신감을 얻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셨나요?”
“브라질을 좋아하긴 하는데 브라질 사람은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이것이 그녀와 내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헤어질 때 택시를 잡지 못하는 그녀를 우리 일행의 차에 태워줄까 하다가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위로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이튿날 푸켓에서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파통이라는 길을 지나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친구가 그녀의 손금을 봐주었습니다. 점괘는 이랬습니다.
“재물운은 있는데 남자운은 별로예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당신의 돈을 보고 오는 거랍니다.”

그녀는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고, 나 역시 그 점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함께 바닷가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헤어지기 전 나는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중에 필리핀 밴드가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들에게 <사랑의 미로>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친구에게 이탈리아에서는 청혼할 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오 솔레미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이별을 장식할 이벤트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밴드 리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남자고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해 허니문을 왔는데 신부를 위해 <오 솔레미오>를 불러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리더는 흔쾌히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와인을 주문해놓고 한참이 지나도록 신청한 노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밴드의 리더가 간주 중에 황급히 다가와 다음이 당신 노래이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도로 앉자 리더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인 신랑과 이탈리아인 신부가 허니문을 왔습니다.”
<오 솔레미오>가 시작되자 레스토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부처럼 나에게 춤을 청했고 나는 신랑처럼 그녀와 춤을 추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그녀는 푸켓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꽤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서 아직도 푸켓에 있는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메르디앙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이벤트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식사를 하는데 <오 솔레미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셀 수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했지만 한 번도 <오 솔레미오>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또 춤을 추었습니다. 밴드에게 우리를 기억하고 불러준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우리는 호텔 아래 협곡에 있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물놀이를 했습니다.
내가 문득 고개를 들어 달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 그녀가 갑자기 내게로 와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 솔레미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별과 출렁거리는 파도와 춤추는 그녀의 노래가 내 가슴속에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그녀가 나에게 키스 했습니다.
우리는 또 헤어졌지만 나는 그것이 마지막 키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 또 그녀를 만날지 모릅니다. 추억을 간직하는 한, <오 솔레미오>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틀림없이 또 만날 겁니다.
인연은 손금보다 확실한 운명입니다.
그녀가 보낸 이메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뜨는 태양이고 나는 지는 달입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의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알렉스 김
아이들의 꿈을 찍는 포토그래퍼. 내셔널지오그래픽 인물상 부문 수상자. 알피니스트. 신세대 유목민. 파키스탄 알렉스초등학교 이사장. 원정자원봉사자. 에세이스트.
 |
이름은 알렉스이지만 부산 사투리가 구수한 남자. 스무 살 때 해난구조요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무작정 배낭을 메고 해외로 떠났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든 카메라에 담았다. 하늘, 햇빛, 바람, 구름,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자연의 위대함에 겸손을 배우고, 하늘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욕심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은 스승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 척박한 환경과 가난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파키스탄에 알렉스초등학교를 지었다.
65명의 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선모임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여행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현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알렉스 타이하우스’라는 태국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단을 조직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고산지역 오지마을로 식량, 의약품,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 오지에 두 번째 알렉스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머물며 김만덕기념관이 추진 중인, 지역 어르신 1,000명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어르신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에 재능기부 포토그래퍼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