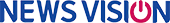[뉴스비전e 이장혁 기자] 시련은 영웅의 통과의례다. 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영웅이 되기도 어렵지만 운좋게 된다고 해도 스토리가 재미없다.
영웅과 시련은 모든 아버지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강한 아들로 키우고 싶지만, 정작 그 강함을 만들 시련 앞에서 주저하게 마련이다.
사자가 새끼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기어올라오는 놈만 키운다는 '낭설(사자는 자기 새끼가 아닐 때만 그런다)'을 믿고 어느 '사람' 아버지가 '사람' 아들에게 그런 비정하고 무모한 시험을 하겠는가?
김승연 한화 회장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때문이다.
김 회장의 자식사랑은 유별나다.
그룹 후계자로 낙점한(?) 장남 김동관에 대한 애착이 가장 커 보인다.
두 동생과 달리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 들으며 명문 하버드를 나오고 공군 장교로 전역해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는 장남이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룹의 미래를 건 태양광사업을 맡긴 것도 그래서였다.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선 김동관의 사업 성공 리포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는 당연해 보인다.
한화는 5년간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그룹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태양광사업에만 9조 원을 쏟아붓는다. 주력인 석유화학과 방산 투자금을 합한 것과 맞먹는다. 김동관의 성공스토리를 연출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사업 리스크다. 태양광사업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그런데도 김 회장은 김동관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김동관은 2010년 그룹 회장실 차장으로 한화에 발을 들였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라고 하기에 김 회장은 조급했을 것이다. 다른 아들들보다 김동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김동관을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으로 보내 태양광사업을 맡겼다.
김동관의 태양광사업은 과평가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그룹이 나서 성과에 대한 김동관의 기여도를 부각시키고 언론도 황태자의 경영수업 성적을 치켜세웠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김 회장의 지원이 전폭적이었다.
김 회장도 ‘새끼 사자’를 벼랑 끝에 세울 자신은 없어 보인다.
창업주 김종희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29세 젊은 나이에 회장 자리에 올라야 했던 고통의 기억 때문일까. 자식들에게만큼은 시련과 역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보인다.
김동관은 아직 전무다. 태양광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
공(功)은 가져오는 대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김동관의 현위치다. 한마디로 잘 되면 전무 덕이고 잘못되면 사장 탓을 할 수 있다.
공(功)을 독식한 사례도 많지만, 과(過)에서 빠져나간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소송전에서 드러났다. 태양광사업 관련 기술이 전무했던 한화는 설비제조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4년간 제휴했다. 계약 종료 후 한화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와 부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키워갔다. 이 과정에서 제휴했던 중견기업이 한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술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소장의 피고소인 명단에서 ‘김동관’이란 이름이 사라졌다고 알려졌다.
원고측은 “소송 내용과 상관이 없어 뺐다”고 설명했다지만, 태양광사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임원이 핵심설비기술의 특허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송 이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김 회장도 김동관이 꽃길만 걷길 바랄 테지만 세상은 꽃길만 걸어온 꽃미남을 영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전무’로 계속 남길 것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CEO’로 배수진을 칠 것인가?
승부의 날이 다가올수록 김 회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더 근본적인 고민은 사업의 불확실성이다. 태양광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찻잔 위에 등불 같다.
(한화 김동관의 ‘태양의 그늘’② ‘태양에 부는 바람’에서 계속)